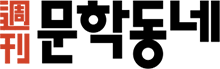나는 바람이 몹시 부는 11월의 마지막 토요일 낮에 한 대학 정문으로 들어선다. 왼 발목이 약간 뻐근한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느릿한 걸음걸이를 더 느리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. 그러는 동안 바람이 긴 머리칼을 마구 헝클어뜨린다.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다가 도로 트인다. 콧물이 흐르고 기침도 난다. ‘목도리를 하고 올걸.’ 후회가 밀려드는 찰나, 검은 정장을 빼입은 키 큰 남자가 깜짝쇼에 등장하는 마술사처럼 나타나 앞을 가로막아 선다. 그가 오른팔을 휙 쳐들더니 만면에 웃음을 띠고서 손끝으로 허공을 가볍게 튕기듯 친다.
“……맞죠?”
뜻밖에도 박력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그가 뭐라 뭐라 하고는 윗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드는데, 멍해진 나는 앞의 말은 다 놓치고 ‘맞죠?’만을 알아듣는다. 그의 지갑 색깔은 아마도 미드나이트블루일 것이다. 안쪽 면에는 ‘L&L’이라는 작은 글자가 은빛 자수로 새겨져 있다. 나는 그 글자들이 정확히 &을 사이에 둔 두 개의 L이 맞는지 한번 더 눈으로 확인한다. 남자가 지갑에서 갸름한 종이를 꺼내어 강조하듯 흔든다.
“김지오 양미향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.”
어라. 아침에 클래식 동호회 카페 게시판에다가 오늘자 음악회 티켓 한 장을 급히 양도하겠다고 글을 올린 사람이 혹시 이분인가? 나는 흐트러진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고는 자연스레 손으로 얼굴을 쓱 쓸어내려 티 나지 않게 코도 닦는다. 한 호흡 쉬었다가 입을 뗀다.
“흑오소리님?”
“그쪽은 송……”
“맞아요, 제가 송소하예요.”
나는 티켓을 받아들고 잠깐 내용을 확인한다. 다시 바람이 일어 머리칼을 휘저어놓지만 좋은 인상을 주려고, 기쁨을 전하려고 눈으로도 입으로도 웃어 보인다. 머리칼을 한 올도 빠짐없이 뒤로 넘겨 빗어 머리통에 단단히 고정한 그의 스타일이 그제야 놀랍게 다가온다.
“고맙습니다.”
“저도요. 표를 그냥 날리면 아깝잖아요.”
우리는 잠시 시선을 교환한다. 남자는 콧대가 높고 바르며 눈동자는 검은색이다. 눈 흰자가 선명하게 희다. 오소리와 닮은 데는 없어 보인다. 이제 나는 찬바람이 부는 주말 한낮의 캠퍼스에서 그가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나를 알아본 건지 물어봐야 할 차례라는 걸 안다. 클래식 동호회 카페에서 나처럼 본명 그대로를 닉네임으로 쓰는 사람이 간혹 있는지 어떤지를 대화로 풀어갈 수도 있음을 안다.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.
“외투를 안 입으셨네요. 춥지 않으세요?”
내가 걸어 나가며 묻자 그가 따라붙으며 대꾸한다. 오름아트홀 옆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여덟 살 난 조카가 자기를 기다린다고, 그애한테 코트를 맡겨뒀고 자기는 원래 몸에 열이 많으니 아무렇지 않다고. 그러고서 시선을 내 발끝으로 미끄러뜨려 나는 괜찮은 거냐고도 묻는다. 내가 줄곧 왼발을 바닥에 약간 끌면서 걷고 있기 때문이다. 나는 괜찮다고도 괜찮지 않다고도 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흘려들은 체한다. 다른 말을 잇댄다.
“저랑도 거기서 보기로 하신 거였잖아요. 오름아트홀 옆의 스타벅스.”
그는 우리의 약속 시각은 지금으로부터 이십 분 뒤라고, 자기도 밖에서 이렇게 진즉에 나와 마주치게 될 줄을 몰랐다며 사람 좋아 보이게 하하 웃는다. 분실한 물건이 있어서 근처를 훑고 돌아다녀본 참인데 물건도 찾고 마침 나도 찾았으니 일석이조라고도.
일석이조. 하필 그가 그런 사자성어를 떠올린 게 우습고도 이상하다. 나는 그가 던진 돌 하나와 그걸로 획득한 두 마리의 새에 대해서 좀더 파고들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추측하지만, 그보다는 지금 내게서 재스민향이 나는지, 그게 바람을 타고 몽땅 어딘가로 휩쓸려간 건 아닌지를 더 궁금해한다.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고서 새 롱부츠를 신고 집밖으로 나설 적에 여동생이 “운동화를 신지 그래” 하면서 마치 ‘아휴 속상해’ 하듯 한숨을 내뱉었던 걸 떠올린다.
우리는 나란히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선다. 그가 하향 버튼을 누르자 얼마 안 있어 문이 열린다. 오름아트홀은 캠퍼스 내에 있는 실내악 연주회장으로, 대학 정문을 통과해 사백 미터쯤 걸어가다 지하 일층으로 내려가면 나온다. 네이버 길찾기 정보에 따르면 그렇고, 체감상으로도 비슷한 것 같다. 좁은 엘리베이터에 그와 내가 나란히 올라선다. 윙 소리와 함께 우리가 아래층으로 옮겨질 때 나는 무릎 바로 아래까지 올라오는 내 롱부츠가 전혀 길들지 않은 새것이라서 지난여름 다친 왼발에 적잖게 부담이 되며, 부츠를 벗어던지기 전까지는 점점 통증이 깊어지리란 걸 인지한다.
또 한편으로는 다른 것들도 헤아려보고 있다. 이를테면 부츠가 소가죽인데도 비교적 가볍고 표면이 감탄하리만큼 부들부들하고 매끈한 점, 굽 높이가 삼 센티미터라 어느 복장에나 무난하게 어울리고 발바닥이 닿는 면에 맞춤하게 쿠션이 있는 점. 엘리베이터가 스르륵 멈추어 선다. 그때 가슴 안쪽 어디선가 ‘달칵’ 하고 저항 없이 어떤 고리 같은 게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이어질 연주회가 이미 마음에 든다. 두 다리에 무척 근사한 가죽 보호대를 차고서 그리로 가고 있다고 여긴다. 문이 열린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