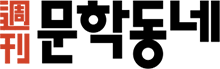언젠가 소설이 끝나는 순간에 대한 산문을 쓴 적이 있다. 소설이 끝날 때마다 어떤 음악들이 남았다. 이 소설을 쓰는 동안에는 미국의 색소포니스트 스탠 게츠와 브라질의 기타리스트 주앙 지우베르투의 , 일본의 재즈 피아니스트 마쓰이 게이코의 를 들었다. 시디 케이스를 반복적으로 열고 닫는 시간에 여러 문장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.
겨울이 끝나갈 무렵 시작한 소설을 여름의 초입에서 완성했다. 이 소설은 유독 끝내기가 어려웠다. 아니,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다. 멈춤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처럼, 이 소설은 내가 없어도 계속 쓰일 것 같았다. 서운하고 울적한 마음이 들었다.
소설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. 쓰고자 했던 장면들이 아닌 쓰이지 않은 장면들로 이 소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. 아직 재생되지 않은 트랙처럼.
뭔가가 좋아지기를 바란다.
일 센티미터라도.
소설을 향한 기대는 오직 이것뿐이다.
2025년 6월
민병훈